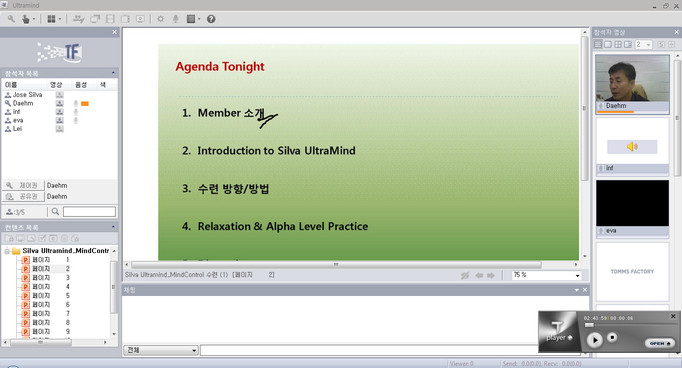홍익학당 및 홍익선원 윤홍식 대표님의 천부경(天符經) 강의 2부입니다. -홍익학당 네이버tv : https://tv.naver.com/hihd
에 의해서 장 대흠 | 9월 23, 2014 | Personal Growth, 홍익학당
마지막 10분간, ‘일종무종일(一終無終一)’에 대한 해석은 대단한 반전이고 압권이란 생각입니다. 천부경은 모든 게 無로 돌아간다는 소승적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 대승을 말하고 있고 결국 인간 세상을 양심으로 잘 경영하여 잘 살자는 가르침이네요.
천부경은 해석들마다 차이가 크고 논란도 많지만 윤홍식 대표는 이를 인도, 중국, 서양의 다른 지식들과 비교하며 설명하는, 자명함으로 추구하는 스타일이니 보다 설득력 있습니다. 천부경 강의 듣다가 감동 먹을 줄은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
천부경에 대해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군요.
홍익학당 및 홍익선원 윤홍식 대표님의 천부경(天符經) 강의 2부입니다.
에 의해서 장 대흠 | 9월 22, 2014 | Others, Science
잠이나 꿈은 마인드콘트롤의 일종인 실바 메쏘드(Silva Method)와 관련이 깊어서 나중에 이야기 소재로 쓰려고 차원용 소장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허락없이 퍼 담았습니다. 부디 용서하소서… ^_^
차원용 소장/교수/MBA/공학박사/미래학자
아스팩기술경영연구소(주) 대표, 국제미래학회 과학기술위원장, (사)창조경제연구회 이사, (사)한국지식재산상업화협회 부회장, 연세대학원/KAIST IP-CEO 겸임교수
번역문 출처: 차원용, ‘상상 현실이 되다.’
미국 버팔로 의대와 하버드 의대 과학자들이 우리가 깊은 잠(Deep sleep)에 빠지는 메커니즘과 담당 부위를 찾아냈습니다. 연구자들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빛으로 신경세포를 껐다 켰다 조절하는 광유전학(Optogenetic) 기술로 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그것은 바로 뇌의 뇌간(생명의 뇌, Brainstem)에 위치한 뇌교(Pons, 꿈) 안 쪽에 있는 PB(Parabrachial nucleus)의 바로 아래에 위치한 연수(medullary)의 PZ(Parafacial zone)가 잠을 촉진시키는 회로(circuit)라는 것을 밝혀냈는데(Anaclet & Fuller et al., Nature Neuroscience, 17 Aug 2014), 이는 포유동물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잠은 잠자는 동안 해로운 이물질들을 청소하여(신경교가 담당) 건강에 이롭기 때문입니다.
* Science Daily – No sedative necessary: Scientists discover new ‘sleep node’ in the brain(18 Sep 2014).http://www.sciencedaily.com/releases/2014/09/140918162313.htm
* Anaclet & Fuller et al., “The GABAergic parafacial zone is a medullary slow wave sleep–promoting center”, Nature Neuroscience, Vol. 17, No. 9, pp. 1217-1224, 17 Aug 2014.
http://www.nature.com/neuro/journal/v17/n9/full/nn.3789.html
* 뇌간의 PB와 PZ 위치 확인하기(Supplementary Figure 8: Schematic model of the principal findings described in this study).
http://www.nature.com/neuro/journal/vaop/ncurrent/fig_tab/nn.3789_SF8.html
동물이나 인간이나 깊은 잠을 잘 때에는 매우 느린 잠 파장(slow wave sleep, SWS)인 델타파(0.5~3.5Hz)가 나옵니다. 델타파가 나오면 깊은 수면에 빠져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와 눈동자가 거의 안 움직이는 비렘수면(non-REM sleep) 상태가 됩니다. 이 델타파의 뇌파를 촉진시키고 싱크시키는 곳이 바로 뇌간 깊숙한 곳에 있는 PZ가 콘트롤 센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PZ에 있는 뉴런들이 뇌파의 느린 파장을 활성화(SWS or EEG slow-wave activity=SWA)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간은 생명의 뇌로 살아남기, 숨쉬기, 혈압, 심장박동, 몸의 온도 등을 조절합니다.
광유전학(Optogenetics)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는 빛(Light)을 특정 신경세포에 쏘아 자극하는 광유전자극(Optogenetic Stimulation)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빛을 이용하는 광유전학은 최근 생명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학문으로 미생물이나 식물에서 발견되는 빛에 반응하는 신경세포나 단백질을 인간이나 동물세포에 적용해 신경세포의 여러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빛을 특정 뉴런에 쏘이면 자극을 받아 켜지고, 빛을 안 쏘이면 꺼지는 스위치(Switch)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연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구자들은 PZ에 있는 특정 뉴런이 신경전달물질인 감마 아미노부티르산인 가바(neurotransmitter gamma-aminobutyric acid, GABA)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PZ에 있는 뉴런이 GABA를 만들라는 신호를 시냅스(Synapse)에 보내면 시냅스가 GABA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GABA가 바로 깊은 잠에 빠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기존의 광유전학 기술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빛에 민감한 단백질 수용체(a ‘designer’ receptor)를 발현하는 특정 유전자를 유전공학적으로 만들어서 바이러스에 주입한 후 바이러스를 PZ에 있는 뉴런에 주입했습니다. 그랬더니 뉴런들은 수용체를 만들고 수용체들은 뉴런의 세포막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수용체에 빛을 쏘아 관찰했습니다. 빛을 쏘면 수용체가 신호를 받아 뉴런보고 GABA를 만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뉴런의 명령대로 시냅스가 GABA를 만듭니다. 그랬더니 쥐들은 바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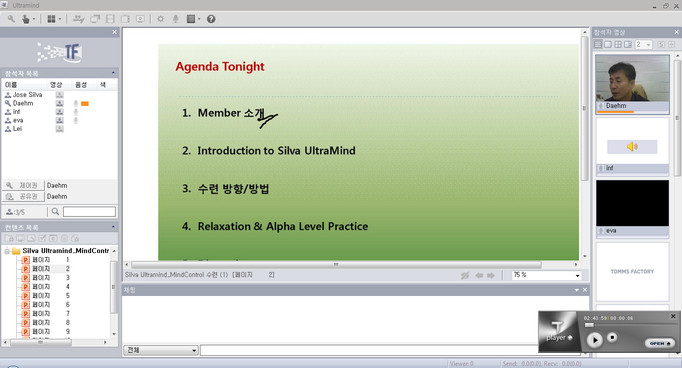
에 의해서 장 대흠 | 9월 19, 2014 | Personal Growth, Silva Method/NLP
이게 2009년도 일이었으니 벌써 5년이 흘렀군요. 몇몇 친구들과 Silva Method라 부르는 마인드콘트롤 온라인 수련 그룹을 만들어 3번 까지 모임을 가졌습니다. 더 오래하지 못한 데에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각자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고 또 그런 걸 이겨낼 강력한 동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기가 약해 중간에 포기하는 건 이런 수련을 하는데 있어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어떤 것이든)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동기가 분명하지 않고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슬라이드는 그때 만든 자료고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개발한 영상 회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습니다. 중국에 사는 우리 회사 개발 이사, 당시 중국의 모 대학에서 중국어 강의를 하던 교수, 그리고 S대학에서 인지과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던 블로그(?) 친구 등 그렇게 넷이 모여서 잡담 형식으로 모임을 가졌는데 제게는 아주 중요한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Silva Method Online 강의

에 의해서 장 대흠 | 9월 7, 2014 | Peoples
이 분 인터뷰 보니 저하고 아주 비슷한 취향을 갖고 있고 걸어온 길도 닮았습니다. 물론 이 분은 저보다 짙은 농도로 이 분야에 관심과 경험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불교, 기독교 등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세례 받으라고 권유를 했는데 종교에 구속될 것 같아서 떠났다고 합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길에서 만난 한 대학생따라 교회에 갔는데 하나님에게 당신 마음의 왕좌를 내주겠냐고 묻길래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
정신 세계원의 송순현 원장님이 요즘도 여러 도인들을 만나고 있는데 언젠가 저에게 도인들 만날 자릴 만들어 주겠노라 하시는 걸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이 분은 도인이라 할 수는 없지만 한번 뵙고 싶네요. 할 얘기도 많을 것 같고 제가 처한 현실에서 궁금한 것도, 배울 것도 많은 분 같습니다.
방건웅 박사는 형이상학자이며 끌어당김의 법칙을 1930년대 부터 강의했다고 하는 네빌 고다드로부터 영향을 받아 이 길에 접어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홀과 웜홀 개념을 창시한 미국의 물리학자 휠러(John Archibald Wheeler) 박사를 알게 되면서 양자물리학의 세계를 접하게 되고,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1984년에는 아버지의 권유로 읽게 된 80년대를 강타한 소설 ‘단(丹)’을 읽고 주인공이었던 봉우 선생도 만나뵈었다고 하네요. 이후 기존의 환단고기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아 스스로 공부하면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대의 경전인 참전계경, 천부경 등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로서 그의 정신세계에 대한 관심은 결국 신과학(New Age Science)에 이르게 됩니다. 한 과학자가 어린 시절 종교에서 신비세계를 거쳐 새로운 차원의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과정을 담담하게 이야기 합니다.
방건웅 박사 소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책임연구원
공학박사로, 1952년에 원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노스웨스턴대학교 대학원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덕연구단지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내 신소재특성평가센터의 책임연구원으로 미세조직연구그룹의 리더이며, 한국공학한림원 준회원으로 한국정신과학학회 이사, 한국열처리공학회 기술이사, 응용미약자기에너지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1991년부터 신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고 자료 수집과 동시에 연구를 시작했다. 공학자로서 『철강열처리의 기본원리』(공역) 등을 번역했으며, 일찍부터 동서양의 정신세계에 관심을 갖고 『성서 밖의 예수』, 『나는 티벳의 라마승이었다』(제3권), 『한단고기』, 『참전계경』(공역) 등의 책을 옮겼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출처: 미내사
* 미내사와의 인연
* Everything is informaion
* 유학시절의 경험이 미친 영향
* 우리 역사와 사상에 대한 관심
* 신과학이 세상을 바꾼다
* 기가 세상을 움직인다
* 비국소성의 세계
* 우주의 연속성에 대하여 – 우주엔 시공간이 없다
* 인류의 생존을 위하여 – 생명의 연속성
* 무병을 위한 의학
* 환경보전과 문명의 지속을 위하여 – 에너지문제
[embedplusvideo height=”593″ width=”752″ editlink=”http://bit.ly/1rTUWhe” standard=”http://www.youtube.com/v/ST1rq2SyOiI?fs=1″ vars=”ytid=ST1rq2SyOiI&width=752&height=593&start=&stop=&rs=w&hd=0&autoplay=0&react=1&chapters=¬es=” id=”ep7771″ /]
에 의해서 장 대흠 | 8월 27, 2014 | 자료실#9
어느 게시판에서 발견한 배영순(영남대 국사과교수)님의 글을 퍼왔습니다.
출처: http://www.thinkpool.com/MiniBbs/ViewPost.do?action=read&hid=whdqo119&cid=mini&ctg=1&viewType=1&sn=1397928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이야기 할 때 주목하는 것이 의식(意識)이다.
이를테면 동물에는 문명사가 없고 인간에는 문명사가 있다는 것의 차이,
그 차이를 인간 의식의 발달로 설명한다. 그러나 정말 인간의 의식이란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의식이란 것을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일까? 그 점을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불교의 유식학에서는 5식, 6식, 7식, 8식이라는 개념을 쓴다. 7식과 8식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본질계로 통하는 것이니까 이건 일단 차치하고 5식과 6식만을 놓고 보자.
5식이란 건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이라는 다섯 가닥의 감각에 기초하기 때문에 오식(五識)이라고 하는 것이다.
6식이란 게 우리가 말하는 의식인데 이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5식의 통합개념이다. 그러니까 5식의 통합과 상호연관성 정도가 의식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의식(6식)이란 것은 5식이 상호 연관적으로 체계적으로 작동할 때, 그 본래적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5식이 따로 놀거나 단절되나 또는 상호 충돌하면 의식이란 것은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달리 말하면 5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성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6식(의식)을 갖고 있지만 실제 하는 짓은 5식 수준, 기껏해야 5식에서 6식에 걸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의식이란 게 어느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을까? 견물생심(見物生心)이란 말처럼, 보는 대로 욕심이 동하고 끌려가는 것, 이게 5식 수준이다. 그리고 ‘오매 좋은 것!’ 이런 것도 5식 수준이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혹해서 상황판단이 마비되는 것이다.
그리고 5식 상호간의 회로가 끊어지는 경우도 많다. 가령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충고나 조언을 듣는다. 들을 때는 ‘아! 이제부터 달라져야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내 하던 짓을 되풀이한다. 귀로 듣는 것과 몸으로 하는 짓은 따로 노는 것이다. 이식(耳識)과 신식(身識)이 따로 노는 것이다.
5관이 따로 논다는 것, 사물이나 대상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파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객관적 인식과도 거리가 멀고 합리적 인식과도 거리가 멀다. 멀어도 너무 멀다.
또 5식이 상호 충돌하면서 버그를 일으키는 경우도 다반사다. 번연히 보면서도 말은 다르게 하는 것이다.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고 그러나 말로 옮길 때는 저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의식이란 게 꼼수밖에 나올 게 없다. 해야 할 것을 안하는 꼼수,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꼼수밖에 나올 게 없다. 합리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합리화의 꼼수만 난무한다.
인간이 이성적이라고 하지만, 도무지 이성이 작동할 수 없는 이유도 이런 것이다. 5식의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상호충돌하면서 버그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우리가 소통과 공감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자신의 오식 상호간에도 소통이 안 되는 바에야 타자와의 소통이나 공감은 날 샌 이야기이다. 그 점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다. 인간은 분명 6식(의식)을 갖고 있지만 그걸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5식이란 게 하나의 연관된 체계로서 통합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7식이니 8식이니 하는 어려운 개념을 갖고 오기 이전에 5감 그 각각의 고유한 감수성을 회복하고 오감 상호간의 회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학습을 통해서 오감의 상호연관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인간발달의 일차적 과제다. 6식의 존재자 내지 6식의 향유자가 인간개발의 첫 출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기초가 오감학습(五感學習)이다.
배영순(영남대 국사과교수/ baeysoon)